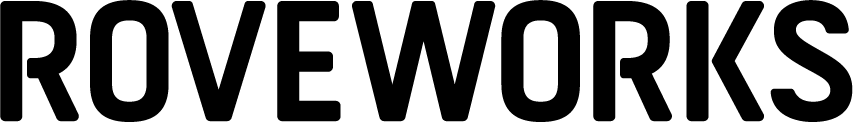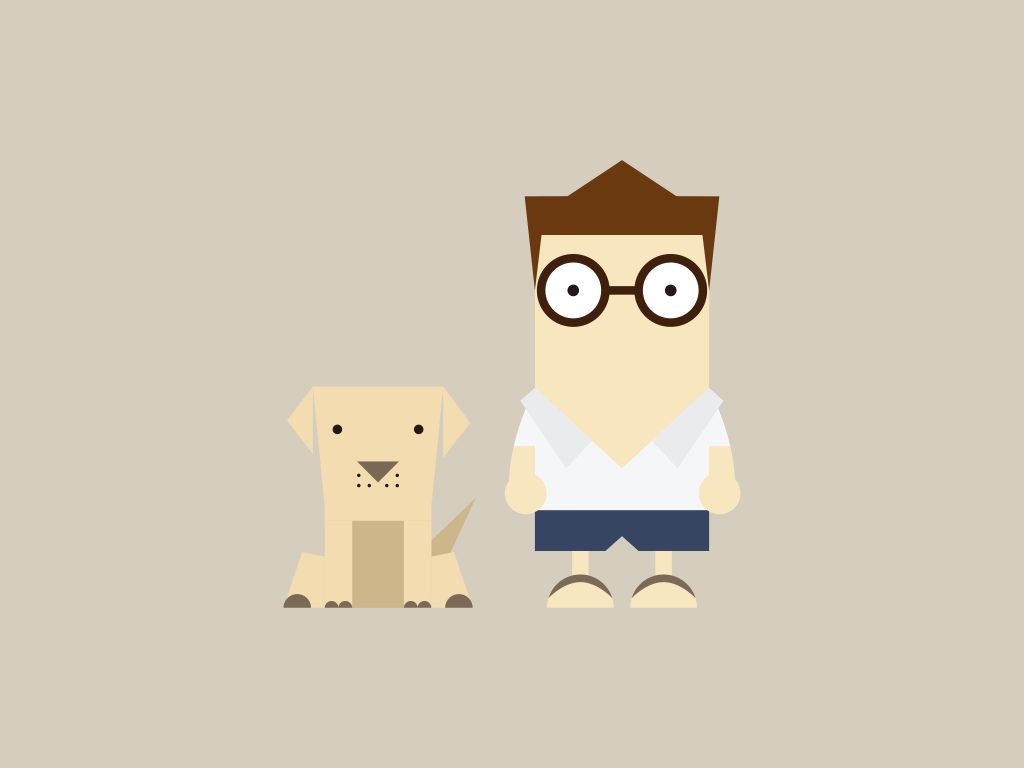겨울에 태어나서였을까. 어린 시절부터 나는 언제나 여름보다 겨울이 좋았다. 특히 늦가을이 저물 무렵, 하루 사이에도 미묘하게 달라지는 아침 공기의 청량함은 매번 기다려지는 선물 같았다. 해가 바뀌는 끝맺음과 시작이 공존하는 계절, 그 차분하고도 설레는 분위기는 감성적인 나의 성향과 유난히 잘 맞았다.
반면, 여름은 언제나 나에게 혹독한 계절이었다. 유난히 더위를 잘 타는 탓에,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다. 한 해는 7월 한창 더울 무렵, 군에 입대해 겪었던 고생이 여름을 더욱 꺼리게 만든 기억으로 남았다. 몇 년 전 집을 지을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7월의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착공해, 10월 선선한 바람이 불 무렵에야 공사가 끝났다. 그해의 폭염은 외부 공사 현장에서 온몸으로 견뎌야 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더위와 맞서 싸운 해마다 “몇십 년 만의 폭염”이라는 뉴스가 어김없이 들려왔다.
그렇게 손사레를 칠 정도로 싫어하던 계절이 좋아지게 된 계기는,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시작하면서다. 집 앞마당에 한여름 햇빛을 가득 머금은 꽃들이 피고, 나무들이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름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계절만은 아니었다. 새벽녘 창문을 열면 풀잎에서 맺힌 이슬이 반짝이고, 장맛비에 씻긴 나무들이 한층 짙어진 초록을 뽐냈다. 그렇게 여름에만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생명력은 나의 일상에도 활기를 불어 넣었다.
이제 여름이 가진 생명력의 무게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은 자라나는 것들에게 필요하고, 습하고 숨 막히는 공기마저도 그 성장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어쩌면 내가 여름을 견디지 못했던 이유는, 그 뜨거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었으리라. 이제 여름이 오면, 나는 더 이상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는다. 대신 하루 중 가장 시원한 시간에 마당에 나가 풀잎 사이를 거닐고, 그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면 그만이다. 여전히 땀은 흐르지만, 그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모든 것들이 나를 감싸준다.
겨울이 내 마음을 차분히 다독였다면, 여름은 내 삶을 숨 쉬게 했다. 그렇게 나는 계절과 화해했고, 여름은 이제 내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조각이 되었다. 어느새 입추가 지나고, 한낮의 열기는 여전하지만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스민다. 벌써부터 아쉬운 마음이 느껴지는 걸 보면, 나는 이미 이 계절과 사랑에 빠져버린건 아닐까?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가장 많은 핀잔을 듣는 계절일지라도, 나는 이 뜨겁고 생기 있는 계절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품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