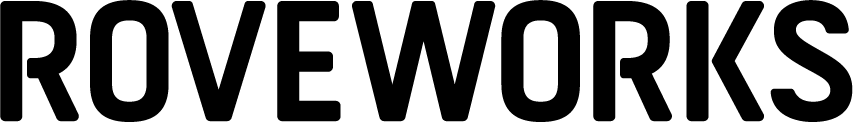“꾸에에엥!”
아직 해가 완전히 고개를 들지 못해 어둑한 안방에서 고요한 적막을 깨고 우렁찬 소리가 들려온다. 이제 갓 백일을 넘긴 둘째의 울음소리다. 사람이 곁에 가서 토닥여주지 않으면 올 때까지 울어대니 이보다 성능 좋은 알람이 과연 있을까 싶다.
“그만 좀 울어!”
올해로 일곱 살이 된 첫째는 터울이 큰 누나의 위엄을 보여주려는 듯, 이불 속에서 오만상을 찌푸리며 둘째의 침대를 향해 크게 한번 쏘아댄다. 그리고 조금 머쓱했는지 일어나 둘째를 토닥여주고 있던 엄마에게 다가가 한마디 한다.
“내가 엄마 대신 혼 좀냈어. 너무 시끄럽잖아.”
그런 누나의 불만을 알리 없는 둘째는 자기 침대에 사람이 많이 온 것에 만족스러운지 울음을 멈추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해맑은 얼굴을 보여준다. 본능에 충실한 얼굴 근육이 만들어내는 아기의 미소에 아내와 나는 무장해제되어 버린다.

아내는 아침 식사를 챙기고 첫째의 유치원 등원 준비로 매일 아침 분주하다. 나는 나름대로 아내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 둘째의 첫 수유를 담당하거나 환기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커피를 내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서 마시곤 했지만,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다. 때문에 우린 커피 머신을 새로 들였고, 정신없이 바쁜 아침에도 나와 아내는 꽤 괜찮은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첫째는 요즘 부쩍 밥투정이 심해졌다. 뭐든 잘 먹던 아이였으니 아내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엄마가 해준 음식 중에 뭐가 제일 좋냐’는 친구 엄마의 질문에 ‘삶은 달걀’이라고 대답해서 아내의 뒷목을 잡게 만들었을 정도이니 이미 보통은 아닌 듯하다. 한 번씩 혼낼까 싶다가도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 딸의 수준은 귀여울 정도이니 그만두게 된다.


둘째가 생긴 뒤로 매일 아침 첫째의 유치원 등하원은 나의 몫이다. 평소 집 밖에 나갈 일이 없는 나로서는 그 짧은 외출이 그리 귀찮게 느껴지지 않는다. 짧지만 딸과의 오붓한 시간과 더불어 그날의 날씨와 공기와 거리의 분위기를 느끼고 돌아올 수 있으니 제법 괜찮은 시간이다. 가끔 나가기 전 아내가 ‘진짜 그러고 나갈 거야?’라며 나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것만 제외하면 말이다.
최근 나의 옷차림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이 많다. 한 달에 몇 번 없는 외부 미팅 자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집에만 있는 편이니 옷이 가진 패션의 기능에 많이 둔감해졌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밑밥을 좀 깔자면 원래부터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나름 쇼핑을 좋아하고 브랜드와 디자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었지만, 전원주택으로 이주하고 재택근무가 정착되면서 옷의 심미적 기능보다는 편한 것에 더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그마저도 안 입는 옷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몹시 거슬려 처분했더니 늘 입던 옷만 입게 된 것이 아내는 보기 좋지 않았던 모양이다.
지금도 아내는 자꾸 옷 좀 사 입으라고 성화지만, 내 기준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 새로운 옷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마음 같아서는 마크 저커버그나 스티브 잡스처럼 매일 똑같은 옷만 계속 입고 싶은 생각도 든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성공을 담보해야 아내의 불만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 같기에 실행에는 시간이 좀 걸릴 듯하다. 지금의 내가 한다면 그냥 남루한 아저씨로 보일 것 같다는 아내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래도 아직은 어려서 뭘 입어도 멋지다고 말해주는 딸이 있기에 오늘도 난 옷차림에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딸과 함께 집을 나선다.

첫째는 요즘 차 안에서 듣는 ‘미스터리 동화’에 꽂혀있다. 귀신, 괴물 등이 나오는 이야기를 무서워하면서도 계속 듣는 아이의 취향에 벌써부터 그 미묘한 카타르시스를 즐기는가 싶어 신기하기도 하다. 너무 집중하며 듣기에 내가 던지는 농담에는 반응도 하지 않는다. 하루 중에 얼마 되지 않는 둘만의 오붓한 시간인데 조금 서운하기도 하다. 그래도 유치원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부둥켜 안으며 인사하는 시간이 좋다. 딸은 헤어지기 전, 나의 입술에 입을 꼭 맞추며 인사를 해준다. 처음 유치원에 입학했을 무렵에는 헤어지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고 많이 울기도 했지만, 어느새 그런 모습은 거의 사라지고 밝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니 조금 뭉클하기도 하다. 그렇게 성장해가는 아이를 매일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사뭇 고맙게 느껴진다.
첫째를 들여보내고 차로 돌아오면 여전히 ‘미스터리 동화’가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아이가 없는 차 안에서는 계속 들을 이유가 없으니 난 바로 라디오 버튼을 누른다. 내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것은 KBS 라디오 클래식 채널의 ‘신윤주의 가정음악’이다. 집에 돌아오는 10분 남짓 되는 시간에 유일하게 허락되는 나만의 선택 권한이기도 하다. 전곡을 다 들을 수 없을뿐더러 가끔은 멘트만 듣다가 집에 도착하기도 하지만, 디제이의 안정되고 편안한 목소리 톤과 은은하게 들려오는 클래식 선율이 분주했던 아침의 마음을 편안하게 달래준다. 아침 9시 무렵, 가정주부라면 집안 일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시간일 테니 왜 ‘가정음악’이라고 제목을 붙였는지 수긍하게 된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역시나 집안 일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아내는 ‘가정음악’을 들을 여유조차 없어 보인다.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는 아이를 돌보는 동시에 밀린 빨래를 하고 청소와 설거지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나도 할 일이 있으니 응원의 한마디를 전하고 이층으로 올라간다.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일에 충실할 뿐임에도 그렇게 올라갈 때마다 미안한 감정이 든다.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쁘지 않을 때는 한번씩 내려와 일을 분담하곤 하지만, 아내는 나보다 더 칼같이 자르며 공과 사의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준다. 덕분에 나는 출퇴근의 경계가 없는 재택 근무자의 고충을 크게 느끼지 않으며 나름 편하게 아침 일과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불편했다. 자유롭고 변칙적인 일상이 주는 창조적 영감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규칙적인 시스템에서의 적응이 힘들어 첫 직장에서 일년 만에 퇴사하고 지금까지 혼자 일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일상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내 일상은 어쩌면 안정적으로 반복되는 리듬이 있어야 변주를 더 극적으로 느끼는 음악과도 결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신윤주의 가정음악’에서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처럼, 때론 지루하고 평범하게 느껴지는 음악이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언젠가는 전율이 일어날 만큼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듯이 말이다.
작년에 인상 깊에 보아서 감상 후기까지 남겼던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 남겼던 글이 마무리에 어울릴 것 같다.(관련 글 : 일상이 영감이 되는 영화 : 퍼펙트 데이즈) 내가 그 영화에 감동했던 이유가 어쩌면 지금의 나의 인생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인생에서의 반복은 희석이 아니라 중첩이다. 하루하루 더해질수록 단단해지는 그의 일상을 통해 언젠가는 무너졌던 적이 있었을 자아를 강하게 지탱하며 말로 설명할 필요 없는 스스로의 존엄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