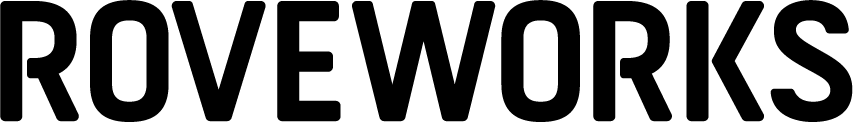신혼여행을 다낭으로 간다고 하니 몇몇 지인들 사이에서 재고의 권유를 많이 받았다. 다낭은 언제든지 편하게 갈 수 있을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은 곳이니 평생 한번 뿐인 신혼여행은 좀 더 특별한 곳을 선택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에 만족했다. 남들이 부담없이 다녀오곤 했던 그 곳이 우린 처음이기도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함의 기준이 ‘여행지’는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우리의 다낭은 여러가지로 특별했다. 데이트 할 때 함께 즐겼던 쌀국수, 장거리 비행을 싫어하는 성향, 계획 없이 느긋하게 즐기는 여행 방식 등이 모두 같았던 우리 둘에겐 이만한 곳도 없었다.

10월의 다낭은 생각보다 덥지 않은 날씨였다. 목적지 없이 걷기 좋아하는 우리에게는 참 좋은 계절이라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지난 여름 찜통 더위의 기억이 채 가시지 않았을 무렵이었기에 생각보다 선선한 밤공기가 마냥 기분이 좋았던 거다.

숙소는 제법 괜찮은 곳으로 선택했다. 크진 않지만 테라스에 단독 수영장이 있는 아늑한 리조트였다. 물을 좋아하는 와이프는 수영을 못해 허우적 대면서도 매일 수영복을 입고 어린애처럼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호이안도 좋았다. 한국인이 많긴 했지만 특유의 북적거림도 거슬리지 않았고 조명들이 켜진 운치 있는 야경과 함께 상인들이 가내 수공업으로 만들어 진열해 놓은 제각각의 물건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음식은 더할 나위 없었다. 다낭 성당 근처 노상 식당에서 먹었던 한화 3천원 정도의 쌀국수가 내 인생 최고의 쌀국수였다. 우리가 그 동안 먹어왔던 쌀국수에 배신감이 느껴졌다. 한번으로는 아쉬워 귀국날 마지막 식사를 위해 다시 찾았을 정도.

정해지지 않은 루트로 하염없이 걸으며 우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생소한 거리를 걸으며 매 순간 느껴지는 낯선 감정을 공유했고 그 거리가 주는 영감에 대해서 거침 없이 표현했다. 낯선 길, 오래된 건물, 순박한 사람들, 지나가며 보이는 모든 것들이 좋은 대화 주제가 되었다.
수세기의 역사와 과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다낭이라는 도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많은 것들이 이제 막 새로운 세계에 첫 발을 내딛은 한쌍에게는 좋은 기억으로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이 곳을 찾았을 때, 지금의 기억이 어떻게 남아 있을지 무척 기대되는 여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