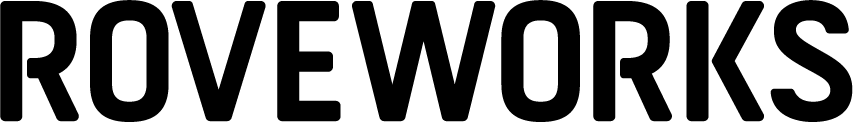그동안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해 본 적이 있었을까? 핏줄로 이어진 이 필연적 관계에서는 상식적인 관계의 미학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좋아한다고 더 가까워지거나, 혹은 반대로 싫다고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
외아들이었던 나는 성인이 되기까지 그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배움이 전혀 없었다. 투박한 인생을 살아온 아버지라는 사람은 가장이라는 사회가 내려준 직함에 따라 그저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을 뿐이었고, 그 보조자 역할을 강요받았던 어머니는 무탈한 일상이 그저 감사해 보일 뿐이었다. 그런 환경에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그저 사치였다. 나 또한 그저 그런 가정에서의 평범한 자식의 역할로서 순응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건 바람직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었다.
문제는 내가 성인이 돼서 발생했다. 어느새 머리가 커버린 가족의 순응자는 가장의 생각과 행동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는 그저 방관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것이었으리라. 사춘기 때에도 하지 않던 반항을 다 커서 하게 되는 꼴이라니.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고, 아버지와 나는 마치 담배연기 같았다. 끊지도 못하고 가까이하면 역한 냄새만을 남기는 모순적 관계.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고 오가는 대화도 없었다. 그렇게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마지막 학기에 전공 필수과목이었던 ‘사진 스튜디오’ 수업의 마지막 과제가 날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자신의 ‘아버지’를 찍어오라는 것. 언제 넣어두었는지도 모를 만큼 오랫동안 냉동실 구석에 들어가 있던 ‘아버지’라는 차디찬 식재료는 순식간에 내 대학 졸업에 가장 필요한 메인 재료가 되어 버렸다. 당시의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서는 사진은커녕 말 한마디 붙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대충 동네 아저씨를 찍거나 인터넷을 뒤져서 과제를 대신하기에는 그 또한 스스로에 대한 기만이라 느껴졌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그때부터 나는 집안에서 아버지의 동선을 조금씩 흘겨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지독히 외로워 보였다. 언젠가부터 어머니와의 대화도 단절된 채, 퇴근 후 집안에서 가까이 붙어 있는 거라곤 TV 리모컨뿐이었다. 그렇게 있다가 베란다에 가서 한 개씩 피우는 담배가 유일한 위안인 듯했다. 짙게 내뿜는 담배연기가 한숨 섞인 입김과 더불어 더 처량해 보였다. 당시의 나는 그 모습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그렇게 며칠을 말없이 관찰하던 중, 그날은 무슨 용기가 생겼었는지 나는 베란다로 나가 있는 아버지에게 말없이 그냥 다가가 카메라를 들이댔다. 언제나처럼 대화는 일절 없었다. 그저 담배 연기 때문이었는지 숨막힐 것 같은 그 공간에 셔터 소리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대충 몇 장을 찍고 뒤늦게 겸연쩍어진 나는 그저 우두커니 서서 카메라 액정으로 사진을 확인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던 아버지는 담배를 비벼 끄고 거실로 들어가며 나지막히 한마디를 던졌다.
“잘 나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