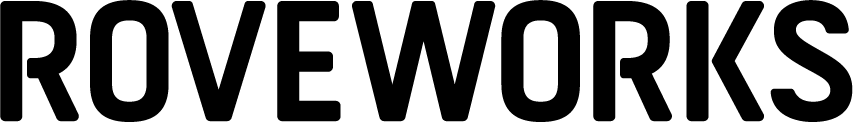2017년 10월. 나와 아내는 9년 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 했다. 연애의 종착점이라고 해야할지, 새로운 출발이 맞을지 당시에는 참 오묘한 기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실 나는 비혼주의자에 가까웠다.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는데 있어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로 꼭 귀결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9년이라는 연애 기간도 남들이 보는 시선 처럼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아내와 함께 ‘가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삶의 비전 때문이었다.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지만, 그 관계에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부여함으로써 더 진취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의 밑바닥을 다 보았음에도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긴 시간을 함께 해준 지금의 아내는 이미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평생 독거노인으로 살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이 사람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결혼식은 최대한 간소하게 라는 원칙을 세웠다. 결혼의 본질에 조금이라도 벗어난다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하게 생략했다.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결혼식이었다.

준비하면서 ‘왜 결혼을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수도 없이 던져 보았다. 막상 하려니 아쉬워서가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내린 나름의 결론을 스스로에게 깊게 새기며 앞으로의 결혼생활에서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주변에 인생 선배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혼과 관련한 조언은 따로 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나눈 대화들, 그리고 그에 대한 결정을 마음이 동요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사랑도, 결혼도, 인생도. 그렇게 생각하니 ‘결혼’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결혼식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신혼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난히도 맑았던 하늘과, 기분 좋은 바람과, 따뜻한 햇살은 여느 때의 가을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득 결혼은 그런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냥 그대로인 것. 그래서 더 좋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