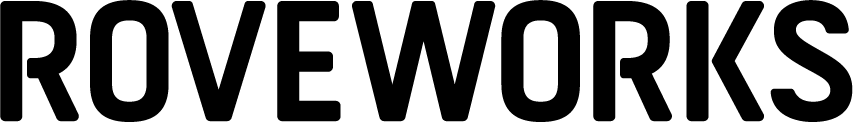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군을 전역하고 대학에 막 복학한 나는 하루하루 불안한 심리에 휩싸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도 목표도 없이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살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입대를 연기하고 재수까지 결심할 정도로 나름 큰 포부를 가지고 들어갔던 대학 생활은 기대만큼 이상적이지 않았고 열심히 해야 할 동기부여도 없었다. 그에 대한 인과로 받은 형편없는 학점은 비싼 등록금을 축내고 있는 한심한 인간의 모습으로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시기였다. 전공은 심화과정으로 들어갈수록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았고 이에 대한 도피로 휴학을 결정해 성장의 돌파구를 찾아보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1년 동안 성장한 것은 현실의 내가 아닌 온라인 게임 속 나의 캐릭터가 전부였다. 그렇게 난 중요한 시기에 소모적인 일상을 살고 있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살아있는 시체 같은 스스로의 모습에 치를 떨고 있던 나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지속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때문에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면 조금은 나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당시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비싼 물건인 카메라를 들고 무작정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당시 의욕적인 모습이 전혀 없던 나에게 사진을 찍는 행위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이었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 정도는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거나 사진을 핑계로 목적 없이 떠도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어느 정도 덜어줬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촬영지로 주로 찾아다니던 장소는 대부분 공사가 중단된 건물, 무너진 폐가 등이었다. 신기하게도 그런 곳에 있으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졌다. 목적을 잃고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당시의 나와 닮아 동질감이 느껴져서 였을까.

난 나에게 위안이 되었던 그 폐허 같은 장소에서 희망을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이 곳처럼 혼란스럽고 불안정하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막연하지만 희망은 남아있다. 당신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맙게도 그 작은 몸부림에 공감해 준 친구들이 있어 ‘희망 프로젝트’ 작업을 함께 하게 되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런 방황의 시간마저 소중했다 느껴지지만 자존감이 나락까지 떨어진 당시의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잡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몸은 어른이었지만 내면은 사춘기 청소년들처럼 여리고 물렀기에 그런 내면과 외연의 불일치는 스스로 불안감을 더 키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런 시기가 바로 ‘청춘’이라는 단어로 불리고 있는 것 같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찬란한 시기라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면에서 불안해하는 대다수의 ‘어른 아이’는 아무도 대변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청춘들은 자아를 확립하지 못한 채 사회라는 전쟁터에 뛰어들게 된다. 당시의 나처럼.
이제는 더 이상 ‘청춘’이라고 불릴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난, 언젠가 불안한 그들의 모습을 대면했을 때, 적어도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비난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당시의 나를 추억하고 보다듬 듯, 그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로 마음먹어 본다. 희망은 여전히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