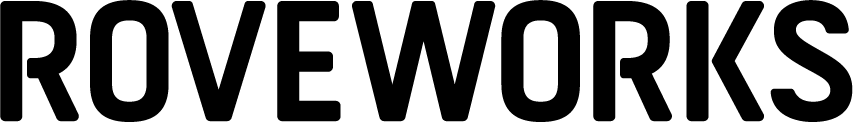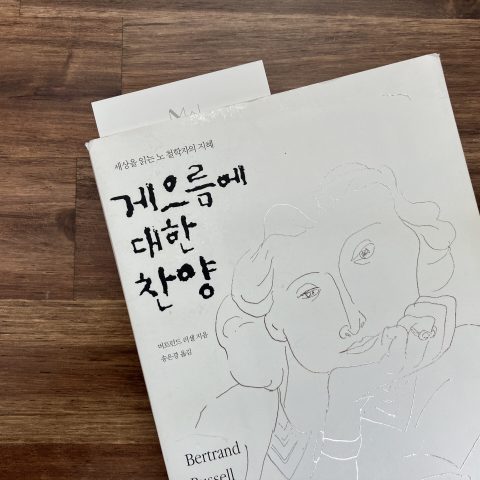80년대 생인 나는 기술의 발전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세대라 할 수 있다. 휴대용 통신기기가 전무할 때부터 공중전화, 삐삐, PSC, 피쳐폰, 스마트폰을 모두 경험했고 컴퓨터보다 사람의 계산이 빠르다며 주판을 통한 셈을 배웠으며 5.2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집어넣고 흑백 화면의 DOS 운영체제에서 컴퓨터를 처음 배운 세대이기도 하다. 때문에 ‘전화’를 의미하는 수화기 모양의 아이콘과 ‘저장’을 의미하는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을 어린 세대들은 모른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기도 했다.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과학 기술의 발전이 유래 없이 빨랐던 시기였는데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디지털(Digital)’이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 기술로 대체되면서 인간 생활은 급속도로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실시간으로 빠른 길을 안내받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의 등장으로 자동차 한켠에 꽂혀 있던 지도책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과,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친구들과 약속을 하기 위해 집으로 전화해서 부모님의 안부를 먼저 물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아주 먼 얘기처럼 들리지만 불과 내가 어렸을 적 일이었다.

이런 ‘라떼 토크’ 조차도 진부하게 느껴질 만큼 세대 간 공감대가 멀어졌지만 굳이 이런 배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격동의 시기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이니 만큼 생활 방식 또한 많은 변곡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어른들이 ‘요즘엔 너무 빨라. 옛날이 더 좋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던 세대였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낙오자들의 푸념 정도로 치부했었지만 최근 주변을 돌아보며 오로지 ‘기술’과 ‘효율’만으로 도배된 주변의 삭막한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직업적으로 IT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는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디지털이었다. 아침에 이메일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그날의 계획을 세울 수 없었으며,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를 주시하며 시간을 보냈다. 일과를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 내 몸과 정신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었지만 불면증과 두통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 편리함의 도구들을 하나씩 의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처분한 것이 스마트워치였다. 이 최신 기술이 집약된 시계는 언젠가부터 스스로 착용하는 목줄처럼 느껴졌다. 지인과 기분 좋은 술자리에서 음주로 인한 심박수 증가를 위험 상황으로 인지해 경고하여 산통을 깨는가 하면, 중요한 미팅 중에 심호흡하라고 조언하고, 어떤 날은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눈치를 주기도 했다. 인간의 건강한 삶을 아주 편협하게 규정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에 제동을 거는 이 오만방자한 디지털 기계를 나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음악 스트리밍과 OTT 플랫폼이다. 어디서든 간편하게 보고 들을 수 있는 음악 스트리밍과 OTT 서비스는 내 취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플랫폼에서 내 취향을 분석해 추천해 주는 콘텐츠는 대부분 국한된 카테고리와 최근 유행하는 것들로 채워졌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던 Ai 알고리즘은 감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요구를 조금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난 넷플릭스가 내 취향과 90% 이상 일치한다고 추천해 준 영화보다 어린 시절 비디오 가게 진열장 앞에서 한 시간 가까이 고민해 골라 본 당시 영화들이 더 기억에 선명하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인데 가장 난제이다. 우린 이 작은 전화기를 통해 일, 금융, 장 보기, 음식 배달, 음악 및 영화 감상 등 일상의 거의 모든 부분을 해결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한 나머지 가까운 지인의 전화번호마저도 외우지 못하는 바보가 되어버렸다. 생각해 보자. 내가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분실한다면 일상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도 나처럼 이 기계에 종속되어 버린 것이다. 적어도 내 기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내 인생에 존재한다는 것이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난 ‘디지털은 과연 인간에게 이로운 것인가?’라는 추상적이면서도 본질적 질문에 도달했다. 만약 그렇다고 믿는다면 디지털을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우리의 선조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결국 디지털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발전했지만 그것이 행복과 직결될 수 없다는 결과를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오히려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이 최신 기술들로 인해 삶의 방향과 목적이 틀어져 버리는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풍요로움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실수를 범한다. 필요 보다 많이 갖기 위해 스스로를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면서 몰두하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의 늪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디지털도 마찬가지다. 이 엄청난 기술은 우리에게 일하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여주는 혁신을 가져왔지만 그로 인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남는 시간을 더 많이 일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이다. 우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한다.
최근 디지털 디톡스와 함께 복고 열풍이 불고 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옛 정취와 경험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이 트렌드는 디지털 시대에 지친 사람이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느끼게 한다. 젊은 세대에게는 복고(Retro)이지만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나에게는 향수(Nostalgia)다. 그렇게 우린 이미 세대를 아울러 같은 것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행복이라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