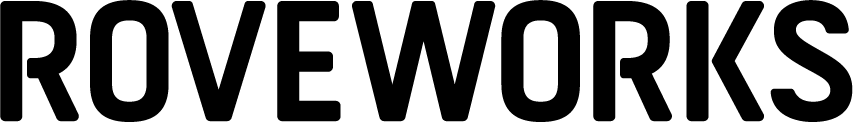어려서부터 등산과는 큰 인연이 없었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들과 소소하게 등산을 경험해 보곤 했지만 그때마다 정상에 올라 맛보는 성취감이 오르기 위한 신체의 고통을 이기지는 못 했던 것 같다. 긴 시간을 걷는 것은 좋았지만 오르는 것은 힘겨웠다. 뒤늦게 ‘산’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된 이유는 어쩌면 이제는 내게 지워진 삶의 무게 보다 정상에 오르는 신체적 고통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등산이 왜 중년들에게 인기 있는 취미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지 새삼 느끼는 대목이다.
제대로 된 등산은 10여 년 전, 지인을 멋모르고 따라갔다가 거의 기어 내려오다시피 했던 북한산의 악몽 이후로 처음이었다. 고도가 완만하고 수월한 코스는 복귀 무대로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어 ‘설악산 대청봉’ 코스를 찾아보았지만 매년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산이라는 기사를 보고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겨울 설경이 아름다우면서도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는 산을 찾아보다 선택한 산이 대한민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소백산’이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사진과 산행기를 찾아보니 정상인 ‘비로봉’에서 남긴 경관의 이미지들이 인상 깊어 직접 보고 싶기도 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 했지만, 등산 장비를 구비하는데 큰돈은 들이지 않기로 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되 필수 장비인 아이젠, 등산 스틱 등은 가성비를 고려하여 최저가로 구매했다. 여담이지만, 등산 스틱을 다이소에서 오천 원에 구매했는데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다. 초보자의 10년 만의 산행이기 때문에 혼자 가기 좀 꺼려졌다. 그래서 오랜 시간 함께 한 지인에게 동반을 제안했는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흔쾌히 동참해 주었다. 아마 나와 같은 이유로 등산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 역시 제대로 된 등산은 꽤 오랜만이라 하여 여러모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당일 새벽 5시에 우린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서 조우했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아니면 설 연휴 바로 전날이기 때문이었는지 우리 말고는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다. 해당 코스로 출발하는 첫 등산객인 듯했다. 칠흑과 같은 숲길과 적막,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는 묘한 공포감까지 느끼게 했다. 둘이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선택한 ‘천동 계곡 코스’는 정상 비로봉까지 왕복 6시간 정도의 코스였다. 짧지 않을 뿐더러, 며칠 전 내린 폭설로 인해 입구부터 쌓여 있는 눈으로 쉽지 않은 산행이었다. 동반자와 페이스를 조절해가며 무리하지 않게 산행을 이어갔다.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지나자 어둠이 걷히고 겨울산의 자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흰 눈을 뒤덮고 있는 나무들과 그 사이로 보이는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하늘, 인적 없는 산의 적막함이 왠지 모를 경건함을 자아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니 그 순간의 분위기를 온전히 몸에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어느새 적응이 되었는지 폐와 근육의 고통도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다.

비로봉에 도착하니 매서운 겨울바람이 산 정상임을 실감케 했다.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풍광 때문이었을까. 3시간 조금 넘게 올라온 정상에서 동반자와 나는 각자 한동안 말없이 주변을 바라보았다. 발아래로 흐르는 운해와 두텁게 쌓여 마치 구름을 옮겨 놓은 듯한 상고대가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 실로 장관이었다.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0년 만에 찾아온 산에서 이런 장관을 경험할 수 있었다니 말이다. 풍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터져 나온 경험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찾는 일상의 자극적인 쾌감과는 결이 다른 만족감이었다. 난 왜 이제야 이런 느낌을 알게 되었을까.

그동안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었을 때, 단지 ‘성취감’과 ‘건강’등으로 돌아오는 대답은 나에게 큰 영감이 되어 주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산행을 통해 알게 되었다. 대자연이 주는 감동은 온전히 자신에게 남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소중한 경험이 된다는 것. 타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힘겹게 올라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꼈던 공허함은 적어도 산에는 없었다.

삶도 그러하다. 정상에 오른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하지만 오르는 내내 멋진 풍경을 보여주며 길을 내어줬던 그날의 산은 과정이 순수하다면 그 오름의 행위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듯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 등산을 꾸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삶의 무게가 오름의 고통보다 가벼워질 그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