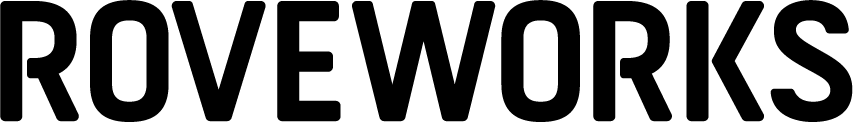올해 초 등산에 본격적인 흥미를 가지게 된 후로 생각보다 자주 산을 찾지 못했다. 먹고살기 바쁘다는 건 핑계 일테고 아직까지는 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듯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고 있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등산가와 아닌 사람의 간극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진다. 내가 골프를 치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골프 모임 사람들에게 등산을 권유했다가 손사래를 치면서 거부반응을 보였던 모습만 봐도 그러한 것 같다.
나 또한 산을 좋아한 만큼 경외심이 크게 자리 잡아 등산을 결심하는데 꽤 오랜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장비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 오늘 내 컨디션은 괜찮은가, 내 체력에 맞는 산일까’ 등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결국 ‘에이, 다음에 여유 되면 가자’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러다 무심코 보게 된 유튜브 예능에서 등산 애호가로 알려져 있는 배우 유해진이 한 말이 크게 와닿았다.
“그 ‘Just Do It’ 이란 말이 있잖아. 나는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 무엇을 하든 마음먹기가 쉽진 않거든. 근데 그냥 생각하지 말고 몸을 움직이면 그게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야. 왜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하면서 고민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등산도 그렇거든.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신발을 신어.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야. 그럼 난 어느새 산을 오르고 있더라고.”
나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단 나가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날은 장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는 것만 확인 후 무작정 가방을 들쳐매고 출발했다. 목적지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지만 늘 멀게만 느껴졌던 치악산이었다. ‘3대 악산’, ‘어려운 산’ 등의 막연한 인상만 가지고 있던 터라 직접 경험해 보면서 나만의 심상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이번 산행은 구룡사 입구에서부터 세렴 폭포를 경유하여 정상인 비로봉까지 이르는 탐방로로 결정했다.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코스라 오르는 내내 시원한 물줄기를 감상할 수 있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자 구룡사의 장엄함과 함께 벌써부터 산의 기운이 느껴졌다. 장마 기간이라 평소보다 물이 많았고 산이 머금은 습한 기운이 피부로 빠르게 전달되어 산과 내가 동화되는 매개체가 되어 주는 것 같았다.

예상한 대로 산행은 쉽지 않았다. 젖은 암괴로 이루어져 있는 등산로는 제법 미끄러웠고 물안개로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며 중간중간에 내리는 비가 몸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런 이유로 장마 때는 보통 산을 잘 타지 않는 것 같았다. 유명한 산임에도 사람이 유독 없는 것이 의아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뭐, 괜찮다. 모르면 고생하면서 배우는 것이 인생의 이치다.


하지만 올라갈수록 ‘오늘 이 산을 찾은 것이 행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벅처벅 떨어지는 빗방울과 뿌연 안개에 수줍게 가려진 숲의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 사이로 흐르는 계곡물이 역동적으로 내리치는 모습은 한 걸음씩 힘겹게 올라가는 나의 모습과 대비되어 중력에 순응하지 않고 역행하는 듯한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다. 오를수록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지만 정상을 향한 마음은 더 강렬해졌다.

힘겹게 정상에 이르자 역시나 전망은 없었다. 희멀건 안개 사이로 스치는 바람이 정상임을 실감케했다. 전망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다. 나에게 정상은 오름의 끝이며 이젠 내려갈 준비를 해야 하는 전환점이라는 의미일 뿐이었다. 그래서 내려다보는 전망 보다는 오히려 오르느라 수고했다고 시야를 가려주면서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한 안개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내려가는 길 역시 쉽지만은 않았다. 이미 체력이 많이 소진된 후라 몸이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내리막에 내딛는 무릎의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져 천천히 그리고 주의 깊게 걸음을 내디뎌야 했다. 더군다나 멋진 풍광을 담아가고 싶어 챙겨간 카메라와 장비들의 무게로 추가된 물리적 고통은 욕망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기에 쉼과 걸음을 반복하며 천천히 하산을 완료했다. 왕복 약 7시간의 여정이었다.
혹자는 등산 한번 하면서 감상이 요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숙련도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 코웃음 칠 정도의 산행기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실제로 하산할 때, 간편한 옷차림으로 에코백을 한쪽에 매고 마실 나온 듯 유유히 나를 제치고 가는 젊은이가 나를 잠시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스로의 한계와 경험의 깊이는 저마다 다르기에 그 사실을 인정해야 좀 더 편안하게 오르고 내려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산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에서도 말이다.
내 개인적인 감상은 차치하고라도 치악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할만하다. 아름다운 숲과 계곡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스스로의 체력의 한계를 시험하기에도 모자람이 없다.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산이 수백 개가 있다는 것은 천혜임에 틀림없다. 물론 산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 자연이 내어주는 길을 걸으며 인생을 다시 배울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의 나처럼.